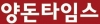일본이 25년만에 900만두 시대가 무너지면서 필자의 마음이 우울해졌다. 한국도 그럴 여지가 높아서다. 한국 양돈업은 1973년 삼성이 용인에 양돈장을 건설하면서 기업들의 진출이 뒤따랐다. 그런 여파로 두수가 급증, 78~79년을 기점으로 돼짓값이 폭락했다.
그럼에도 기업의 양돈업은 계속됐고 농가들의 참여와 전업(轉業)이 반복되면서 80년대 후반까지 왔다. 그러다가 89년 삼성의 양돈업 포기 선언 이후 기업의 양돈장들도 폐쇄했다. 이 기간이 한국의 양돈업 태동기와 과도기라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 농가 중심으로 양돈업이 움직였지만 불황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큰 호황도 없었다. 그 속에서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자’라는 의기가 투합되면서 한국 양돈업은 발전기에 진입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짧았다. 2~3년만에 끝났다. 한해 10만톤 가까이 수출했던 것이 2천년 3월 한국에서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 물거품이 됐다.
그래도 돼지 두수는 줄지 않았다. 97년 700만두로 진입한 이래 2천년 8백만두, 06년 9백만두, 14년 1천만두, 17년 1천1백만두 시대를 열었다. 구제역 이란 역병과 PRRS PED PRDC PMWS 등 4P 질병 속에서 규모를 통한 전업(專業)화가 진행됐다. 이는 농가들의 꾸준한 생산성 제고 노력과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가 늘면서 가능했다.
이를 보면 2천년 이후 한국 양돈업은 성장과 정체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천1백만두에서 진작 1천2백만두로 진입했어야 함에도 근 10년간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유는 많다. 허가제 등 각종 규제와 냄새 등 환경으로 돼지를 늘리는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양돈 2세들 진입도 많지 않은 것도 요인이다.
알다시피 양돈업은 한국 농업에서 생산액 규모로 비중이 제일 높은 산업이다. 국민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 산업이 ‘정체’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해와 관심은 높지 않다. 5년마다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각종 지원에 인색하고, 규제에 앞장서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물가 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입 육류에 대해 할당관세란 제도를 천연덕스럽게 도입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말인데 양돈조합과 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양돈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했으면 한다. 한돈의 우수성과 영양적 가치도 알렸으면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봉사 등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돼지 사양관리에 집중,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럴 때 양돈업이 정체기에 쇠퇴기로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