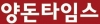카타르 월드컵이 막바지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모두가 어렵다던 16강을 넘었다. 한국팀의 선전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의기소침한 상황에서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선수들의 투혼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월드컵은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 어떤 팀이 축구공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 승부는 달라진다. 민첩하고 정확한 패스, 선수들의 순간적인 선택과 판단, 집중력, 승부 욕망이 승부를 좌우한다. 운(運)도 따라야 한다. 운은 필수 요인도 충분 요인도 아니다. 그대로 운이다. 운은 전체 경기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승리는 운보다는 실력에서 나온다.
월드컵이 축구공 하나로 승부를 결정하듯이 세계 양돈업도 하나의 축구공, 즉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 곡물값’이란 축구공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사료 곡물값은 월드컵의 축구공처럼 세계 양돈농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곡물값이 오르면 함께 힘들고 내리면 같이 수월하다. 물론 국가마다 곡물의 관세와 사용량, 용도에 따라 축구의 패스 능력처럼 차이가 발생한다. 분명한 점은 똑같은 사료곡물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나라마다 생산비(성) 차이가 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한국 선수의 신체적 조건이 유럽에 우월하지 않듯이 한국의 양돈업은 기후 여건에서 불리하다. 유럽은 연중 기온차가 20도 미만이나 한국은 혹서기 혹한기가 뚜렷해 농가들이 사양관리하는데 애를 먹는다.
지형적으로도 유럽이 유리하다. 유럽의 돈사는 평야 지대에 속한 반면 한국은 산에 가깝다. 이에 한국은 들짐승에 의한 질병(ASF) 전파 여지가 높고, 공기 흐름도 느려서 호흡기질환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안고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 유럽의 양돈이 한국처럼 까다로운지 궁금하다. 농장마다 8대 방역시설 갖추라든지, 돼지와 차량 등록하라든지, 돼짓값 오르면 무관세로 수입하는지, 완화보다 규제가 앞장서는지~등등 말이다.
덩달아 국민 시선도 차갑다. 냄새 등 환경과 밀사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그렇다. 심지어 한돈을 축구 용병처럼 인식하고 없으면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철부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다 대체육 배양육 등 ‘가짜 고기’까지 가세, 농가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한국 양돈농가들은 선전하고 있다. 한국 축구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10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것처럼 양돈업 역시 구제역 ASF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고,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돈육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민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반(半)을 전체 육류에서 한돈이 책임지고 있다. 한국 축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것처럼 한돈은 한국을 대표하는 육류다. 그런 만큼 한돈에 대한 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하는 동시에 농가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고품질 한돈 생산에 주력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