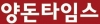무언가를 “살려야 한다” “살리자”라는 주장과 외침에는 긴박함과 절실함, 시급함이 담겨 있다.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때의 피해와 그의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살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고 호미로 막으면서 대처하고 있다.
최근 돼짓값을 보면서 그런(살려야 한다)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금년 들어 돼짓값이 연일 생산비 이하를 형성, 농가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양돈사룟값이 21년(616원)에 비해 kg당 752원으로 22.1%(136원, 사료협회 기준) 올랐기 때문에, 작금의 생산비 이하 돼짓값은 농가의 경영에 있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양돈타임스에서 수차 보도한 바와 같이 돼지 두당 출하할 경우 5~7만원 적자를 보고 있어 농가마다 매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손해를 입고 있다. 문제는 약세의 돼짓값이 삼삼데이 기점으로 회복됐으면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긴 그렇지만, 3.3데이 이후에도 기(氣)를 펴지 못해 ‘살리자’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예년과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
알다시피 국내 경제 여건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다. 3월 중순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지난해의 48%)를 넘어섰고,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도 저녁 10시면 끊겨 음식점들이 적막강산이라 한다. 주식시장도 예년과 다르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돼짓값 반등을 기대하기란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정부를 기대할 순 없다. 물가 잡기에 혈안인 정부의 입장에선 돼짓값 하락이 오히려 반갑기 때문이다. 결국은 농가 스스로 돼짓값 회복에 나서야 한다. 먼저 정부에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6월말로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조합과 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소비홍보를 벌여 돼짓값을 올리는 것이다. 봄나들이, 상춘(賞春)객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소비자와 가깝게 지냈으면 한다.
특히 한돈을 비축했으면 한다. 자조금(작년말 기준 수매 비축자금 130억원)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 약세의 돼짓값을 생산비 수준 또는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면 한다. 돈가 하락으로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가를 ‘살려야’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살아야 농장도 살고 양돈업도 살면서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산업도 살기 때문에 한돈 비축은 무리하지 않다.
양돈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다. 그런 만큼 흔들려서도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된다. 안정돼야 한다. 종사자들이 ‘적자’ 봐서는 안 된다. 생계는 보장해야 한다. 살도록 해야 한다. 그 시점이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