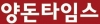예전에는 이름을 신성(神聖)시 한 것 같다. 함부로 못 부르게 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자(字)를 사용하다 성년이 되어선 호(號)를 통해 부르곤 했다. 한편에선 이름 대신 험하게, 예를 들면 ‘개똥아’하고 불렀다.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실제로 고종 임금 이름도 ‘이제황’이었는데 어렸을 때 흥선대원군이 개똥이라 불렀다 한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거치고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시대에 따라 이름 돌림자가 달라지고 있다. 남자는 족보 항렬(行列)에 의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예전에 자(子) 순(順) 숙(淑) 희(姬)에서 최근에는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름이란 명(名)를 파자하면 재밌다. 저녁(夕)에다 입구(口)가 붙어있다. 저녁에 찾을 사람이 잘 보이지 않자 사람을 쉽게 찾자는 의미에서 명(名)자가 지어졌다 한다.
이름과 관련된 속담도 있고 관용구도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이왕이면 사물의 명칭도 좋아야 한다는 “이름이 고와야 듣기도 좋다”가 있다. 또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실속이 없는 “이름 좋은 하눌타리”란 말도 있다. 이와 비슷한 “이름난 잔치 배 고프다”는 속담도 있다. 관용구로는 이름값을 하라, 이름을 남기다, 날리다, 팔다 등이 있다.
양돈으로 돌아오자. 양돈 정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대 개편됐다. 그 과정에, ‘축(畜)’자 한 글자를 첨가하는데 축산관련단체의 간곡하고 절실한 바람이 뒤따랐다. 축산업의 경제 규모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여도(고용인력 창출과 지방경제 주축 등), 향후 발전 가능성(반려동물)을 고려하면 ‘반드시’ ‘축’자 들어가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밭(田)을 기름지게(玄) 하는 축산이 정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또한 묻고 싶다. 10년 전 필자는 사실 기대가 컸다. 정부의 자금도 많이 지원되고 규제도 완화되고~거기에 발맞춰 농가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는~제2의 전성기, 부흥기를 기대했다.
그러기는커녕 축산 관련 부서는 과거에 견줘 줄어들고, 질병을 관장하는 부서는 확대 개편되는 등 본말(本末)이 뒤집혀 졌다. 특히 구제역, ASF, AI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는 폭넓게 강화되면서 깊어져 갔다. 이로써 적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휴폐업했고 전업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축산생산단체와 농협 축산경제가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이란 이름값을 위해 10년간 정책을 분석, 되돌아봤으면 한다. 동시에 축산 발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그럴 때 ‘축산’이란 이름값을 할 것이라고 축산인들은 믿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