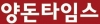양돈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분뇨 에너지화가 좋은 줄은 알지만 정작 농가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액비화 시설과 달리 에너지화 시설의 농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저탄소 축산업 전환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축 분뇨 처리에 있어서 농경지 면적은 지속해서 감소,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 수요는 제한적이라며 처리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종별 분뇨 특성을 고려할 때 돼지 분뇨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바이오가스 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정화)로 반출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에너지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실제 시도별 전업 규모 양돈농장과 가축분뇨 처리 시설 평균 거리를 계산한 결과 퇴·액비화 시설은 6.2㎞, 정화처리 시설은 11.7㎞인데 비해 에너지 생산시설과의 거리는 36.3㎞로 차이가 컸다.
실제 농가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했더니 인근에 생산시설이 없다는 응답률이 46.3%로 높게 나타났다. 퇴액비 시설은 400개소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지만 에너지화 시설은 16개소 뿐이며 충남이 5개소, 경기 3개소, 전남과 경남에 각 2개소 강원‧경북‧전북‧제주지역에는 각각 1개소가 운영되는 등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이 중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 중 약 13%를 사육하는 경북(대구)지역의 경우는 1개의 에너지화 시설이 운영 중으로 양돈장들과의 평균 거리가 78.6km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졌다. 대신 경북도 퇴·액비 시설과의 평균 거리는 7.7km로 양호했다. 이에 농경연은 해당 지역의 퇴액비 시설이나 정화처리 시설을 개보수 및 현 위치에 신축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개편하는 경우 접근성은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입에 있어서 양돈장 밀집 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 및 허가 등의 문제로 신규 도입이 어려운 지역은 퇴·액비화 시설이나, 정화처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편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