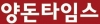한국 양돈업이 의무화(義務化)에 갇혀 있다. 의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등 4대 의무가 있듯이 양돈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다. 새해 6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슬러리 피트 청소’가 의무화다.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도 의무화된다.(24년) 지난해 7대에 이어 8대 방역시설도 갖춰야 한다. 축산농가 개인 차량에 GPS를 장착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은 ‘바이오가스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말 그대로 양돈 의무화 전성(全盛)시대다.
문제는 의무화가 법률로써 권고적 의미가 아니라 강제적 의미를 지닌 점이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해서다. 사실 그렇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지원에서 배제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 한다. 그러니 약자인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안 할 수도 없다.
문제는 양돈에 대한 의무화가 생산성과 경쟁력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는 점이다. 물론 돈을 들여 시설을 갖춘 만큼 방역이나 환경을 위해 도움은 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설에 대해 투자가 중복될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되레 시설 설치로 생산비만 상승,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의무화 ‘남발’은 사고(事故)나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이며 농가에 대한 책임 전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성싶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이 의무화 남발이다. 민-관-산-학-연구계가 각종 지식을 동원, 양돈 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기보다는 쉽게 풀려는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태도와 사고(思考)에서 의무화 남발이 시작돼서다. 어쩌면 그것은 일본 강제 병탄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고,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가 된 지 3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남아있는 관(官)의 ‘식민 잔재’일 수도 있다.
물론 의무화할 것을 자율로 맡기면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 누가 (설치, 사용)했더니 효과가 컸다고 입소문 타면 익히 봐왔듯이 들판의 불길처럼 농장에 번진다. 그때 만든 시설은 형식이 아니라 농장에 필수 요소처럼 꼼꼼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짓는다. 실질이 형식(의무)을 넘어선 순간이다. 농가를 믿고 산업을 길게 본다면 의무보다는 권고와 자율이 더 효과 있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보면 의무화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의무(화)도 큰 범위에서 볼 때 법이다. 법이 많고 법이 전면에 나서는 사회는 힘든 사회다. 법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다.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사회는 준법이 강조되는 사회다. 2023년 새해다. 새해 소망은 양돈업에 ‘의무화’란 법적 조치가 예고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농가도 정부에 책(責) 잡히는,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 진중하고 신중하게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