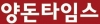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러-우크라 전쟁으로 세계화란 교역 질서가 흔들거리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남은 것은 서로 나눠 갖자는 경제적 ‘맹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체제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도체와 농산물 수출에서 그것을 엿보게 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진행 중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한할 때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미국에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정책을 봐도 ‘자유’보다는 ‘보호’ 무역으로 선회하고 있다. 반도체만이 아니다. 곡물도 마찬가지다. 외신에 의하면 밀, 옥수수, 식용유, 설탕,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26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아가 비료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기상 악화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자원 무기화는 한국의 식량 자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발등의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곡물(사료용 포함) 자급률이 20.2%임에도 말이다. 한때 100%를 초과했던 쌀 자급률도 이제는 9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자급자족’이란 긴박성이 없거나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의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이 이를 잘 웅변해주고 있다.
곡물을 비롯한 육류 등 식량 자급률 설정이나 목표는 개개인이 세울 수 없다. 수입 자유화 시대 가격이 불안해서다.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는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적 지원은 물론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당 산업 보호와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해당 농가와 관련 업계는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돈타임스(6월 16일자)는 정부가 한돈 자급률을 2011년 세운(80%) 다음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참조]그럼에도 농가들은 고군분투하면서 70~75%의 자급률을 유지하면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으로 충실한 역할을 했다. 더욱이 ‘환경’ 부담과 주변 민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양돈업은 일개 농업이 아니다. 농업 가운데 생산액 1위 산업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 및 신규 인력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국민 건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 산업에 자급률 계획이 10년이나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니다. 양돈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