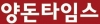농축산부는 그동안 팀으로 운영돼던 동물복지관련 정책을 ‘과’로 출범했다. 그 과도 연구부서의 과(科)가 아닌 시행 및 시험의 과(課)로 운영된다. 또한 소관도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조정됐다. 팀서 과로 승격되고 소관도 국(局)에서 실(室)로 넘어간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신호’이다. ‘축산’에서 ‘생명’으로 이관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나쁜 것은 아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겐 필요한 정책이다. 인간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제공하는 돼지나 소, 닭 등 경제동물에도 필요하다. 사육 면적이나 사육 과정에서 생명체로서 대우할 가치는 충분하다. 위생 등 안전성과 질병발생 저감, 육질 제고를 위해서도 동물복지는 소중한 정책이다.
문제는 축산물 수입 자유화시대, 무한경쟁시대 동물복지를 통한 ‘사육’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점이다. 양돈의 경우 복지는 한풀 꺾인 것 같다. 2013년 이 정책이 실시된 이래 양돈복지농장은 18년말 기준 13곳이다. 시행초엔 4곳, 5곳 증가하더니 전전년도는 1곳만 늘었다. 이는 한마디로 양돈복지는 돈이 덜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으니 돼지끼리 서로 물고 싸워 관리하기 힘들다. 관리가 힘드니 인력이 오려하지 않는다.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오면 인건비 지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적정 사육면적을 유지해야 하니 두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출하 감소는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 사료 역시 이에 맞게 제조 급여해야 한다. 사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출하 일령이 빠르지도 않다. 분뇨 처리에 노동력이 더 든다. 출하 전 절식하고 계류시간 엄수하고 적정 출하 두수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복지를 적용한 한돈에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 소비자 반응도 밋밋하다. 되레 비싸다며 눈살을 찌푸린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복지보다 안전성을 우선 둔 것으로 나타나 ‘양돈 복지’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농장들의 투자 대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이다. 이러니 복지를 적용할 농가들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해됐다.
한돈과 경쟁 육류인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복지를 통해 사육된 돈육과 돈육 부산물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복지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기준과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입 돈육에 대한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려운 사안이다. 양돈복지가 자칫 잘못하다간 한돈에 대한 역차별 불만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 대상을 반려동물과 경제동물로 구분하고 경제동물에 대한 적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복지는 국제경쟁력과 연관성이 약해서다.